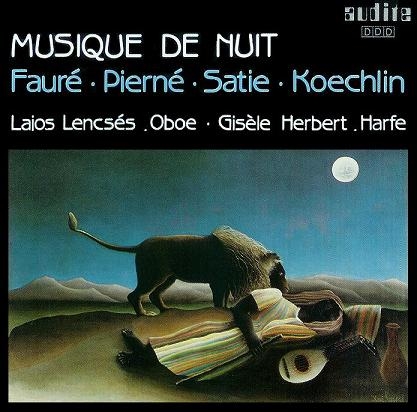<빈 상자>를 통한 해체적 시읽기의 즐거움 /김영찬
(시) 빈 상자
- 이 민 하
팔색조 한 마리를 상자에 담아 그에게 보낸다. 상자를 열자 새는 공기를 휘젓고 사라지고 그는 상자를 버린다. 꽃나무를 담아 상자를 보낸다. 그는 꽃나무를 정원에 옮겨 놓고 상자를 버린다. 책을 담아 상자를 보낸다. 그는 책을 책꽂이에 꽂아 두고 상자는 버린다. 책을 읽던 그는 지친 눈을 들어 정원을 바라본다. 키가 자란 꽃나무 위에 팔색조가 돌아와 몸을 푼다. 나는 벽시계를 담아 상자를 보낸다. 그는 벽시계를 벽에 기대 놓고 상자는 버린다. 그가 벽시계를 꽝꽝 벽에 박아 넣는 동안 그림 연습을 하던 나는 실물보다 더 진짜 같은 무지개를 그려 상자에 담아 보낸다. 무지개는 액자에 갇히고 상자는 버려진다. 피노키오 코처럼 길어진 시계바늘이 정원을 겨눈다. 꽃과 새가 하나씩 화살에 꽂힌다.
나는 빈 상자를 그에게 보낸다. 뚜껑을 열고 닫고 이리저리 살피다 그는 잠든다. 나는 빈 상자를 자꾸 만든다. 저녁이면 그가 산책하는 공원에도 가지 않는다. 내 방은 빈 상자로 꽉 찬다. 수소문한 그가 전화를 걸어온다. 나는 대답 대신 빈 상자를 자꾸 보낸다. 빈 상자를 넣을 빈 상자를 만든다. 상자 속에 상자 속에 상자를 넣어 작은 상자 큰 상자 자꾸 보낸다. 뚜껑을 열며 뚜껑을 열며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는 그 속에서 잠을 잔다. 상자 모서리에 매달려 커다란 상자를 두르던 나도 잠을 잔다. 어김없이 찾아온 트럭이 커다란 상자를 운반한다. 흔들림에 잠을 깬 내가 그에게 도착한다. 상자 속에 상자 속에 잠든 그는 내가 온 줄 모른다. 나는 상자를 뚫으려 두 팔을 휘두른다. 상자를 빠져나오자 낯익은 이불이 납작하게 접혀진다. 낯익은 벽들이 각을 세우고 천장을 조인다.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트럭이 내 방을 싣는다.
『문학과사회』2005년 11월 <겨울호>에 게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빈 상자>를 통한 해체적 시읽기의 즐거움
김영찬(시인)
이민하의 시는 참 맛깔스럽다. 맛있고 재밌다. 그의 어떤 시는 너무 재미있고 쫄깃쫄깃해서 나는 그의 맛있는 언어들을 입안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며 조금씩 아껴서 읽고 싶을 때가 있다. 그가 평범한 독자인 나를 이처럼 매료시켜 시의 행간 깊숙이 끌어들이는 비법은 무엇일까. 나는 그의 시가 매우 낯설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는 회화에 있어서의 데포르마시옹기법을 시작법으로 채택, 자유연상법을 차용하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자유 상상에 의한 환상적 시작법을 구사하는 시인들이 이미 여럿 포진해있는 상황에서 이 점을 이 시인의 특성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너무 진부한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민하 시인 은 황병승, 김행숙, 유형진, 진수미, 신해욱 등등, 일련의 젊은 미래파 시인들 모두가 아마도 그러리라고 추정되듯이 원고지 대신 컴퓨터 자판을 다루는데 익숙한 소위, 자동기술법 시쓰기에 능한 신세대 시인 중의 한 명인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그의 모던한 틀, 상큼한 詩想의 깔끔함이란 일군의 미래파 시인들의 면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의 시가 기상천외한 이미지를 창출, 모호성 다의성을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나는 그의 시를 대할 때마다 즐겁다. 그런 그의 시를 재미있고 참신하게 특징짓는 한 요소로써 나는 ‘낯설게 하기’, 데뻬이즈망의 시학을 거론하고 싶다. 그는 시의 소재를 가깝지만 낯선 곳에서 채택한다. 낯선 곳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낯설고 난삽한 것이 아닌, 우리가 접근해 본 바 없었으나 접근하기 쉬웠고 언젠가 한번은 접근을 시도했었거나 접근했었을 법한 주제를 천연덕스럽게 설정한 후 다시 낯선 詩的 장치에 의해 독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전위적 기법을 구사하는 점에서 데뻬이즈망 시학이라고 생각한다. 돌발적인 여건조성(이미지와 이미지의 우발적 관계 설정), 돌발적 환경 바꾸기(강압적 이미지 결합기법이 자주 나타난다). 그로인해 파생되는 그의 시는 당연히 낯설다. 낯선 가운데 특이한 친근감을 조성하며 다가서는 시의 맛, 그것이 바로 이민하가 성공하고 있는 시적 장치가 아닌가 싶다. 그의 시, 2005년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발표된 ‘빈 상자’를 들여다보자. ‘빈 상자’ 같은 주제는. 아주 평범한 제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자주 채택했음직한 ‘빈 방, ’빈 집, ‘빈 수레, 또는 ‘빈 벌판’과 그닥 다를 바 없는 소재, 흔해터진 질료이다. 그러나 분명 ‘빈 집’과 ‘빈 상자’의 차이는 詩的 발상에서 한 차원 다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시를 읽으며 ‘낯선 추억’과 만나는 기분에 빠진다. ‘낯선 추억’이라니…? 그의 시 한 행, 한 행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분명 낯설기는 한데 그러나 그냥 낯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번은 내가 꿈속에서 스쳐지나 갔음직한 추억 하나를 어떤 계기(이민하가 설정한)에 의하여 들춰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팔색조 한 마리를 상자에 담아 그에게 보낸다. 상자를 열자 새는 공기를 휘젓고 사라지고 그는 상자를 버린다. 꽃나무를 담아 상자를 보낸다. 그는 꽃나무를 정원에 옮겨 놓고 상자를 버린다.>로 시작하는 그의 시, ‘빈 상자’의 첫 도입부 몇 구절은 이렇게 천연덕스럽다. 우리가 은연중 무의식 중에 한번쯤 시도해봤음직한 일(빈 상자에 의표를 담아 제3의 타자에게 보내고 싶은 행위)을 바로 지금 이민하 시인이 새로이 끌어내 독자인 우리들에게 환기시키자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나는 그의 시, ‘빈 상자’를 읽으며 ‘빈 상자를 넣을 빈 상자 만들기’에 줄곧 개입하게 된다. 그것은 시인이 의도한 의미망에 관계없이(내가 만일 평론가라면 ‘빈 상자 = 자궁이라는 억지 발상도 가능했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 편하고 쉬운 발상일 뿐인 ’빈 상자‘를 재구성,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빈 것, ‘빈 상자’를 계속 만들어 나갈 자유를 획득한 셈이다. <빈 상자>란 무엇인가? 그 어떤 詩도 빈 것, 빈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 노동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참에 나는 詩야말로 ‘빈 상자’처럼 많은 것을 담게 해주는 <빈 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왜 중요한가를 상기하고 싶다.
*
서두에 나는 이민하의 시들은 나에게 맛있는 시라고 말했다. 읽는 재미가 쏠쏠한 시. 그래서 나는 그의 어떤 시는 너무 재미있어 그 언어를 한 입속에 오래오래 넣고 맛을 내며 아껴서 읽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맛을 내며 읽는다고? 아까워서 아껴가며 읽는다고 말하게 된다. 어떤 비법이 있기에 그의 시는 나에게 이처럼 맛깔스러운 것일까? 나는 그의 시를 읽으며 <창조적 책읽기>라는 말을 되뇌인다. 그가 채택한 언어의 질감 속으로 천천히 빠져 들어가 그의 시상 속에 몰입한 상태에서의 시읽기야 말로 나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시인이 독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리라. 우리는 시를 읽으며 시의 도입부에서 이미 시인의 의도와 마주친다. 시인의 의표대로 시는 진행하고 독자는 시인이 은유하는 길을 따라 그 길로만 산책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시는 정말 재미가 없다. 단순하고 뻔한 논리,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형국이라서 얕은 물에 노는 고기를 빤히 바라보며 낚시질하는 것같이 객쩍다.
그러므로 나는 시가 여러 방향으로 분절음을 만들며 가능한 한 다중성을 띄고 깊어가는 상징성을 중요시 여긴다. 시인이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잃은 채 여행할 수도 있는 시, 독자가 상상에 기대어 읽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확보되는 시. 그런 시라야 시를 읽는 맛이 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인의 의도를 일부러 거슬러 반대로 해득하게 되는, 역방향으로 짚어나가며 읽을 수도 있는 재미! 해체주의자들의 포스트모던한 책읽기, 해체적 책읽기 讀法은 그래서 가히 혁명적이다. 이처럼 시읽기를 통해 상상의 기쁨을 많이 제공받게 되는 시를 나는 맛깔스러운 시라고 표현한 것일 뿐.
아이들이 하나 둘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했겠지
아이들의 입에서 가시 돋친 고양이들이 튀어나와
물결 속으로 겹겹이 사라졌겠지
아이들은 은종을 울리고 새들이 걸어와 눈을 맞췄겠지
백발의 소년은 돋보기안경을 벗었겠지
눈가의 주름이 나비처럼 나풀거렸겠지
‘마술피리’ 부분, 시집 <환상수족>(2005, 열림원)
이민하의 첫시집, <환상수족>에 수록된 시, ‘마술피리’의 한 부분이다. 시인은 주제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따왔다. 그가 선택한 주제란 전술한 바처럼 아주 낯선 것만은 아니다. 낯설다면 마술피리가 안내하는 그늘진 숲속의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들이다. <아이들이 하나 둘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한>다는 것은 범상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에서 가시 돋친 고양이들이 튀어나와/물결 속으로 겹겹이 사라졌>다는 대목에 이르러 우리는 낯설다. <백발의 소년은 돋보기안경을 벗었겠지/눈가의 주름이 나비처럼 나풀거렸겠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합리적 관계가 단절되고 ‘강압적인 이미지 연결’이라는 이질적 상황을 만나 일순 당혹스러워지지만, 데뻬이즈망 기법에 따른 시적 연결 장치가 잘 돼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안심하게 된다. 그에 따라 독자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의문과 호기심이며, 의문과 호기심은 상상을 유발한다. 혹시라도 그의 시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고전적 독법을 들고 나서는 일은 없기 바란다. 시는 질서 있는 문자의 배열과는 거리가 멀다. 행과 행 사이를 논리의 잣대로 읽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는 가능한 한 문법과 인습의 바깥에 언어를 배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와 규범 따위는 이민하와 같은 부류에 속한 미래파 시인들 모두에게 거리가 멀다. 정육점에 걸린 신선한 살코기처럼 그의 시어들은 저마다 무게를 지니며 맛깔스러운 빛깔을 유지하고 싶어 할뿐, 발랄한 어휘들의 윤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시는 음악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 시가 진행하는 시공은 언제나 ‘마술피리’의 마술적 음조가 흘러가 닿는 곳이 아니었던가. 거기는 바로 ‘마술피리’의 주술로 환상이 활짝 꽃 피어 있는 빈 곳, 공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 열린 공간에서 시는 관습과 규율, 규범을 넘어 끝없는 상상의 날개를 달고 창조의 무대를 열어나간다. 그렇다면 나는 그가 보여주는 마술피리의 영역으로 잠입해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빈 상자’를 만들어 보내야 한다. 그의 ‘빈 상자’란 시인이 현실과 부딪혀 부단히 불화를 일으키는 세계 내의 공간(詩), 혹은 창조를 위해 순연히 비워진 ‘빈 공간’(모태의 자궁) 그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다. 오랜 구습과 구태의연한 고정관념 등속이 계속 실려 나가고 다시 텅 빈 채로 ‘빈 상자’로만 남게 되는 비극적 진행이 반복될 ‘빈 상자’가 되겠지만, 이 비극은 시지포스의 徒勞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창조를 위한 책읽기의 진행, 창조적 상상 속에서의 행복한 시읽기 그 자체로 귀착될 것이기에 나는 즐겁다.
‹계간지『시평』2006. 2.15일 <봄호>에 게재
-------------------------------------------------------------------
'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패기만만한 문학청년인 김영찬시인 (0) | 2009.07.10 |
|---|---|
| 고독한 탐색, 하이퍼텍스트의 시인 이성렬 (0) | 2008.11.17 |
| 이용한 시집『안녕, 후두둑 씨』-김영찬 서평 (0) | 2008.07.27 |
| 두 시간 저쪽으로 거세게 부는 바람-김영찬 시집,『불멸을 힐끗 쳐다보다 (0) | 2008.04.29 |
| 평론가 남기택 김영찬 시집 서평 (0) | 2008.04.14 |